This time, I'd like to talk about the pumgyeseok(Ranking Stones) that are installed within Seoul's Five Grand Palaces. Korea's pumgyeseok (Ranking Stones) are a unique legacy arising from a distinct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making it difficult to find examples abroad with the exact same function and form. Ultimately, they can only be seen in Seoul's palaces. If you happen to visit Korea, although they may not be extravagant or grand, having prior knowledge about these rank stones will, I believe, make your trip to Seoul more meaningful and interesting.
한국의 품계석(특히 조선 시대 궁궐 내에 설치되어 관료들의 서는 위치를 신분에 따라 정해주던 돌 표식)처럼 공식 행사 시,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신분/계급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물은 외국에서도 비슷한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5대 궁에 설치되어 있는 품계석들처럼 물리적으로 고정된 구조물을 두고 실제 인원 배치까지 한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품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울의 궁들을 방문 시 사전지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투어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품계석의 시초
품계석은 조선 정조 때, 1777년(정조 1년)에 창덕궁 인정전 앞마당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정조가 나라의 공식 행사에 관료들이 품계 없이 섞여 서있는 것을 보고, 조정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품계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덕궁에 세워진 이유는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포함하여 모든 궁들이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고 난 뒤 창덕궁이 가장 먼저 준공되어 창덕궁이 정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계석은 각궁의 정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전은 궁궐 내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건물로, 국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세자 책봉식,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적인 중요 행사가 정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이 신하들의 하례를 받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공식적인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5대 궁에 품계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원래는 정궁역할을 했던 3개 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는 설치되었으나 이궁이었던 2개의 궁(경희궁, 창경궁)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정궁'이란 왕이 공식적으로 거처하는 주된 궁궐을 뜻합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정궁이 국가의 상징이고, 정치·의례·국왕 일상의 중심지였어요.
한편 '이궁'이란 정궁 이외에, 보조적 성격을 가진 별궁을 뜻합니다. 왕이나 왕비가 휴식, 거처 이전, 피난, 질병 요양 등을 위해 사용한 곳이죠.

2. 품계석이 설치된 순서
창덕궁 인정전(1777년)→ 경복궁 근정전(1860) →덕수궁 중화전(1897) →창경궁 명정전(해방 이후)→경희궁 숭정전(1986)
3. 품계석의 구성
좌우로 각각 12개씩 배치되어 총 24개로 구성됩니다. 정전에 가까울수록 높은 품계의 관리가 서는 자리이며, 1품부터 9품까지 정품과 종품을 구분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관직은 1품부터 9품까지 있으며, 각 품은 정품과 종품으로 나누어졌습니다.'정품'은 '종품'보다 높은 품계입니니다. '정'은 임금이 내려다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며, 상위를 나타냅니다. '종'은 따라가는 개념으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하위를 나타냅니다. '종'은 '정'을 보좌하고, 지방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정1품이고 좌찬성, 우찬성이 종1품입니다.
정전을 향해서 오른쪽은 문관, 왼쪽은 무관과 왕실 종친이 서는 것으로 구분되어, 문관이 무관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24개의 품계석은 정/종 1~3품 까지 각 3개씩 총 6개이며 4 품부터 9품까지는 정/종품의 구분이 없어 6개이므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각 12개씩이므로 총 24개가 됩니다.

4. 외국의 유사한 사례
가. 중국 – 품계석과 비슷한 '품계 표시'
명나라·청나라에서도 황궁(자금성) 앞 광장에는 조정에 신하들이 서는 자리가 등급별로 정해져 있었데요.
품계석 같은 고정 구조물은 따로 없었지만, 바닥에 정해진 위치에 신하들이 자신의 관직/품계에 따라 서는 방식이었어요. 대신 옷(관복)이나 모자(관모)의 색과 장식(흉배 무늬 등)으로 품계를 구분했데요.
나. 일본 – 조정 의례와 고쇼(御所) 구조
일본 교토의 고쇼(황궁)에서도 조정 신하들의 자리배치는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식 의례에서 장관과 관리들이 서는 위치가 명확히 규정돼 있었지만, 고정된 돌이나 표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하들의 계급은 의복(법복, 관복)과 머리장식(관모)으로 철저히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다. 이집트– 신전 조각과 부조
고대 이집트 신전 벽화에는 왕, 귀족, 제사장들이 신을 예배하는 장면에서 지위에 따라 위치가 차등되어 묘사됐습니다.
때로는 바닥 패턴이나 조각상 배열로 서열이 나타났지만, 품계석처럼 실제 사람들이 위치를 잡는 물리적 표식은 아니었어요.
라. 영국 – 궁정 서열표 (Order of Precedence)
영국 왕실 행사(예: 대관식, 국왕 연회)에서는 귀족, 주교, 고위 관료들이 서열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배치됩니다.
이때 고정된 표식은 없지만, 행사장에 미리 서열별로 자리를 배치하고, 플래카드나 명패가 설치되기도 해요.
물리적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의전표와 좌석 배치를 통해 서열을 드러내는 경우이에요.
The development of Korea's pumgyeseok can be seen as an instance of adopting a Chinese system and independently evolving it. While China is the closest example, Korea is quite unique in having physically fixed structures like the pumgyeseok and actually arranging personnel based on them. In China, Japan, the UK, and Egypt, while positions were determined, they didn't create fixed structures; instead, they expressed hierarchy through attire or arrangement. With that, I've briefly talked about the pumgyeseok. I hope this information is helpful for your trip to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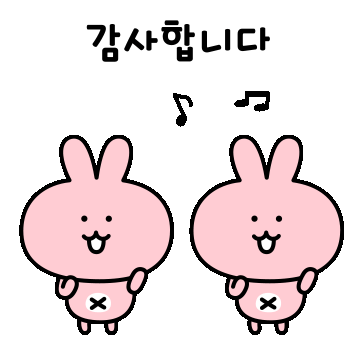
'서울 탐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Whispers in the Secret Garden [창덕궁 후원] (2) | 2025.05.02 |
|---|---|
| A Taste of Seoul: Exploring Markets and Must-Try Korean Foods (8) | 2025.04.26 |
| Reading the Han River Through Events[한강 시간여행] (6) | 2025.04.25 |
| Have You Heard of the Palace Within a Palace?[건청궁] (0) | 2025.04.24 |
| Seoul's Relaxation Spot:Cheonggye Plaza[청계광장] (4) | 2025.04.15 |